-
[06월18일 14: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
작년말, 한 시중은행 투자금융부는 경영진에게 보고할 '2014년 자본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가 긴급하게 보고서를 수정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임원진들이 "구조조정 테마로 2014년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기 때문. 실제로 당시 웬만한 언론과 해외에서 발간된 보고서들은 거래 활성화를 점쳤다.
이러니 '2014년 자본시장이 별 볼일 없다, 또는 실속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올려본들 "그래서 일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책을 들을까봐 보고서를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에 거래가 없진 않다. 그러나 생기(生氣)는 사라진 지 오래다.
한계기업이 자산매각ㆍ구조조정에 나서니 거래가 많을 것이란 예측은 힘을 잃은지 오래다. "H그룹 증권사' , 'D그룹 계열사'등 인기 없는 매물만 수개월째 여러 손을 타고 있다. 시장에서 보이는 이름도 '국책' 산업은행 아니면 모아놓은 자금은 없고 의욕만 넘치는 사모펀드(PEF)운용사 뿐이다. 매각자도, 매물도, 인수후보도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성사가능성? 두말할 것 없다. 매각자도 인수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중개자는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저런 금융회사 매각이 진행됐지만 참가자들 또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찾아갈 인수후보도 국민-신한-하나-농협 네 곳의 금융지주 아니면 두,세 곳의 지방은행이 전부다. 물론 이들의 대답도 시원찮다.
무엇보다 매각대상 자체가 인기가 없다. 업황이 이미 꺾인 기업이거나, 대규모 증자가
필요하거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수천억원을 투자했으니 이 투자금을 갚아줘야 하는 기업이거나. 매번 이런 식이다.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대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얼굴 비친 지 오래됐다. 이들은 대규모 설비투자부터 줄이고 있다. 작년 대기업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3.9%, 중소기업은 14.1%나 줄어들었다. 업종으로 보면 서비스업의 설비투자 감소 폭이 전년대비 16.4%에 달했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새 업종 진출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대형 M&A 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이래봤자 롯데그룹이 거의 전부였다. 삼성 등을 위시한 최상위 대기업들은 꾸준히 M&A 매물 스터디만 하거나 계열사의 소규모 거래에만 집중했다. 대신 빈자리를 채운 것은 MBK파트너스를 위시한 대형 PEF 뿐이었다. 재무적 투자자(FI)들만 득실거리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기업들은 사내에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두기에 급급하다. 아니면 빚을 갚아가며 막바지 디레버리지(Deleverage)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선도한다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의 경우. 이들 그룹 계열사(작년말, 상장사 기준)에 쌓인 현금성 자산만 120조원에 달한다. 삼성그룹이 약 60조원, 현대차가 40조원에 육박한다. 전체 3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157.7조원)의 80%에 달하는 수치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굳이 자본시장을 찾아 자금을 조달할 일도 없다. 기업들이 주식ㆍ채권시장을 찾는 빈도수도 자연히 줄었다. 관련 시장은 죽을 쑤고 있고 IB들은 울상을 지은지 오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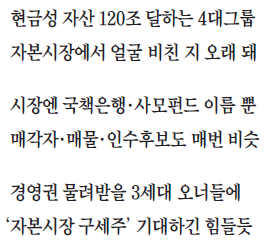
일례로 프라이머리 마켓의 꽃이자, 기업의 자본시장 데뷔전이기도 한 기업공개(IPO) 부문은 올해 아사 직전 상황까지 도달했다. 인베스트조선이 집계한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11년 3조9900억원에 69건에 달하던 국내 IPO시장 규모는 지난 2012~2013년간 1조원, 20~4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유달리 상황이 심각해 5월말 기준 거래소ㆍ코스닥 통틀어 IPO건수가 단 7건에 그친다. 그나마 6월 들어 '삼성 이벤트' (SDSㆍ에버랜드 상장추진)에 죽어가던 불꽃을 살렸다.
회사채 시장도 풀이 죽은지 오래다. 3년전 57조원 가까웠던 일반 회사채 규모가 지난해는 30조원대로 줄었고, 올해는 이보다도 성적이 나쁘다.
'허명무실'(虛名無實)한 시장상황 탓에 IB들도 힘이 빠진 지 오래다. "이런 저런 거래 자문을 많이 맡고 있지만 성사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 (A증권사 IB대표), "수수료 경쟁만 더 치열해질뿐, 연말 보너스는 기대도 하기 힘든 상황" (B증권사 IB대표) 등이다. 경쟁이 극에 달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마타도어'식 마케팅 경쟁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이어질까? 결국 기업들이 주눅이 들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대 참가자가 프라이머리-세컨더리마켓 전부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 자본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기업과 시장관계자들은 두 가지를 배경으로 꼽는다.
하나는 기업들의 '트라우마'(Trauma)다. 대규모 신수종 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에 나서는 데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는 의미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10년 가운데 최대 '활황기'였던 2007~2008년을 두 해에 '기업쇼핑'에 나선 거의 대부분의 그룹들이 비운을 겪었다.
대우건설-대한통운을 함께 품었다가 비극을 맞은 금호아시아나, '태양광-건설-저축은행'이라는 3대 거품업종을 골라 조단위를 투자한 웅진, 노르웨이 아커야즈 인수로 글로벌 그룹 약진까지 꿈꿨던 STX 등이다. 국내 M&A 최고수라는 두산그룹조차 인수금융 차환에 매년 시달렸다. 비단 M&A를 크게 진행하지 않았어도 업황 침체만으로 계열사 매각에 나선 한진-현대그룹도 그렇고, 과거에 진 은행빚에 여전히 시달리는 동부는 두말할 것도 없다. "바로 곁에서 이 모습을 10년 가까이 쳐다봤는데 이제 누가 나서겠느냐"는 얘기다.
또 다른 메가톤급 이슈는 바로 '3세대 오너의 약진'이다. 삼성그룹을 필두로 미루고 미뤘던 대기업의 승계 이슈가 물밀듯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너 승계를 앞두고 기업들이 외부활동, 특히 대규모 투자를 줄이는 것은 당연지사다.외부투자보다는 기존 계열사 점검과 통합, 조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데 온 신경이 집중된다.
입력 2014.06.19 08:30|수정 2014.06.19 08:30
기업들, 신사업 진출 트라우마…대기업, 오너 승계 문제에 골몰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